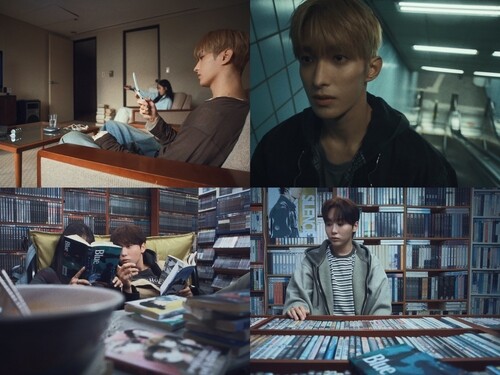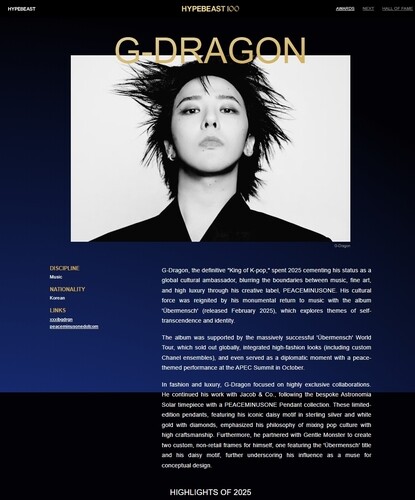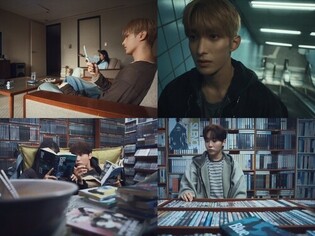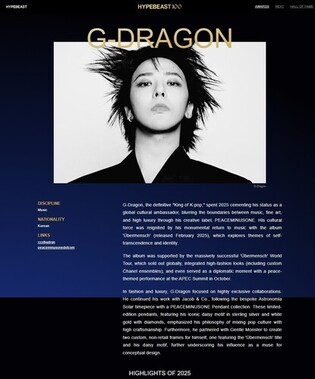|
| ▲ 다양한 털배자 [경운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
| ▲ 송시열 초구 재현품 [경운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
| ▲ 다양한 난모 [경운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
| ▲ 갖두루마기 [경운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
| ▲ 주요 전시품 [경운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옛사람들은 어떻게 추운 겨울을 견뎠을까…'갖옷'에 담긴 이야기
경운박물관·국립대구박물관, 복식 유물 100여 점 한자리에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이 삼가 초구(貂裘) 한 벌을 내려 주신 성은을 입게 되니, 신은 감격스럽고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효종실록 1658년 12월 10일 기사 중에서)
1658년 겨울 효종(재위 1649∼1659)은 우암 송시열(1607∼1689)에게 옷을 하사한다.
초구는 담비 털로 만든 저고리를 일컫는다. 우암은 '분수에 맞지 않는 은혜'를 더해 의복까지 받게 되었다며 사양하지만, 왕은 뜻을 굽히지 않는다.
효종은 "초구는 호화롭게 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따뜻하게 하려는 데 뜻이 있다"고 말했고, 우암은 옷 안쪽 면에 친필로 기록을 남겨 그 마음을 기억한다.
옛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나며 입었던 옷에 주목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경운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이 최근 선보인 기획 전시 '갖옷, 겨울을 건너다'는 짐승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갖옷과 그 역사를 소개하는 자리다.
갖두루마기, 갖저고리, 털배자 등 복식 유물 10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경운박물관 관계자는 "동물의 털을 써서 겨울옷을 짓되, 그 털을 겉으로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고 따뜻함만을 취했던 옛사람의 옷 짓기를 돌아보는 전시"라고 말했다.
전시에서는 갖옷에 담긴 지혜와 정성,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1764∼1845)가 쓴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적힌 갖옷 관련 기록, 효종이 우암에게 하사한 담비 털저고리 재현품 등이 소개된다.
19세기 말∼20세기 초 근대기에 제작된 갖옷도 여럿 볼 수 있다.
흰 토끼털로 저고리 형태를 만들어 덧대거나 여러 모피 조각을 이어 만든 갖저고리가 공개된다. 과거 털옷을 만들던 기술자들의 제작 도구도 함께 전시한다.
마고자, 두루마기를 바탕으로 한 갖옷도 살펴볼 수 있다. 삵(살쾡이)과 양털로 안을 댄 마고자, 한국에서 청설모로 잘 알려진 청서피(靑鼠皮)로 안을 댄 여성 갖두루마기 등이 전시된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품인 모자와 신발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양의 후드처럼 머리에서 어깨까지를 덮는 방한모 휘항(揮項), 이마와 귀·목덜미를 덮어주던 남바위, 부녀자들이 쓰던 아얌 등이 시선을 끈다.
전시는 1900년대에 제작된 망토부터 근현대 남성의 모자, 여성 핸드백과 코트 등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겨울 옷차림도 함께 보여준다.
복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운박물관은 서울 강남구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에 있다.
전시는 12월 27일까지 볼 수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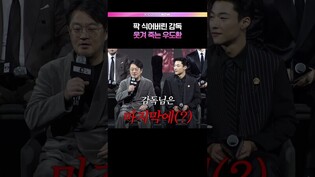

![[풀영상] 디즈니+ '메이드 인 코리아' 제작발표회|현빈 Hyunbin·정우성 Jung Woosung·우도환·서은수·원지안·정성일·강길우·노재원·박용우|Made In Korea](/news/data/20251215/p179554206856695_165_h.jpg)
![[풀영상] 지니 TV '아이돌아이' 제작발표회|최수영 SNSD SOOYOUNG·김재영 Kim Jaeyeong|'I DOL I' Press Conference](/news/data/20251216/p179563204418999_319_h.jpg)